『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존 왈톤 저, 서평: 이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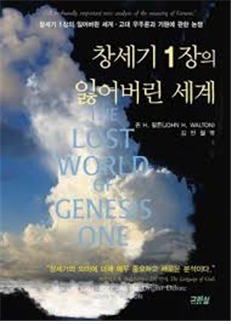
서평: 존 왈톤,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Book Review: John Walton,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이채원Cheawon LEE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이 책은 창세기 1장의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물질의 시작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다고 믿어 왔다. 하지만 저자는 물질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고, 기능의 부여와 시작이 창세기 1장의 주요 관심사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저자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곳적 어느 시점에 물질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하시지만, 그 시점과 방법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즉 창세기 1장의 관심사는 물질의 기원이 아니라 기능의 기원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창세기의 원독자 혹은 원청자가 창세기 1장의 ‘바라<ברא>’ 동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석학적 측면에서 당연한 이야기다. 저자는 의미론적 해석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번역자는 이를 “문자적 해석”이라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 당시의 히브리어 사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자는 ‘바라<ברא>’ 동사가 사용된 구약성경의 용례를 살피고, 고대 근동의 문헌과 창세기 1장을 비교한다. 수메르, 바벨론, 이집트의 고대 근동의 기원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1차 독자가 이해한 단어의 의미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1차 독자가 고대 근동이라는 공통된 세계관적 배경하에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런 방법론에 충분히 동의가 되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단어 용례와 고대 근동의 문헌을 비교한 결과, 저자는 단어 연구에서 ‘바라<ברא>’ 동사의 목적어로 물질적인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가 낮고, 또 기능과 질서를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기원에 관한 문헌들이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기능과 질서를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창세기 1장은 물질의 기원보다는 기능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주장의 논지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창세기 1차 독자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기능과 질서를 부여하시니라’라고 이해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라<ברא>’동사의 일차적 의미를 호도한 것이 아닐까!. ‘바라<ברא>’ 동사의 여러 용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형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흙이라는 형질에서 사람이라는 형질로 변화되고, 죄로 물든 마음을 ‘정한 마음(시편51:10)’으로 창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 동사는 형질의 변화와 질서 부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동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죄로 물든 마음에는 ‘정한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정한 마음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1장 1절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해도 해석상 무리는 없다. ‘바라<ברא>’ 동사가 ‘무로부터 창조’개념도 있는데 굳이 기능 부여라는 측면만 강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의 천지는 분명 다르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기능 부여의 재료가 되는 천지를 무로부터 창조했다고 필자는 본다. 그리고 창세기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이때의 천지는 기능 부여 작업이 끝난 후의 천지다. 창세기1:2절이 전치사 와우<וְ>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절은 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창세기1장1절을 제목으로 보기도 힘들다. 만약 제목이었다면 2장1절에 ‘만물’을 첨가할 필요는 없다. “무로부터 창조”의 결과로 창세기 1장 2절의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과 수면이 생겨난 것이다. ‘바라<ברא>’ 동사가 무에서의 창조의 뜻도 있는데 굳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능 부여라는 의미만 취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무로부터의 창조와 기능의 부여라는 이중적으로 이 동사가 사용되었다고 본다.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창조 설화인 에누마 엘리쉬에도 마르둑(Marduk)은 신들의 전쟁에서 패한 타이맛의 시체를 재료로 천지를 창조했다. 사람은 킹구의 시체로부터 만들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물질이 선제했다기보다 물질의 기원을 신들로부터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백번 양보해서 고대 근동의 신화가 물질세계를 선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성경도 그렇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빈도가 낮긴 하지만 ‘바라<ברא>’ 동사가 “하늘과 땅’’ “세상”을 목적어로 사용하는 경우에 물질적 기원이 아니라 기능의 기원으로 보아야 할 의미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저자가 제시하는 근거는 고대 근동의 문헌과 비교해서 얻은 근거일 뿐이다.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창조를 살펴보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있으라”, “나뉘라”, “모이고 드러내라”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기능들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이 시간, 기후, 먹거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이를 대학캠퍼스 건설에 비유한다. 각각의 건물과 기자재를 갖추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는 “있으라 비치라” “번성하라 날아라”,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를 운영할 직원을 세운다. 저자는 이를 각 건물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직원과 학생이 대학 컴퍼스에 모여드는 것에 비유한다. 그리고 마지막 칠일에는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신다. 그제야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 이로써 천지는 안식하게 된다. 대학으로 비유하자면 총장이 부임해서 총장실에서 학사 일정을 수행하게 되고, 대학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저자는 고대 근동의 우주관과 성전 의식을 창세기 1장에 적용해서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근대 서양의 세계관의 산물인 과학과 일치시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본다. 저자는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비일치론적 입장에 서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과 성경의 양립 가능성을 제안한다. 즉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언제 일어났던, 어떻게 일어났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외에 성경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은 과학의 길을 가고, 신학은 신학의 길을 갈 수 있는 해석학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즉 과학이 제시하는 이론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근거로 거절할 이유가 없다. 각각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질의 영역을 연구하는 과학이 목적론과 형이상학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신학도 물질의 기원에 대한 현상학적인 과학의 발견에 성경을 근거로 배격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학은 “왜 세상이 존재하는가?”, “왜 그 질서가 존재하는가?”를 묻는 것은 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과학 교육은 목적론에 관해서는 중립을 시켜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근대 진화론은 목적론적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연구범위를 초과하여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많은 과학적 성과에 도전을 받고 있다. 전통적 성경해석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발견들을 품을 수가 없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학적 성과들을 무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성과를 반영한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동설을 받아들였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며,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 성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거나, 반지성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저자의 성경해석이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성경과 과학의 양립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모두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둘은 충돌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 지성사는 이 두 계시를 조화시키는 끝없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채원은 국립경상대학교 사회학 전공(B.A, 1999년), 고신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M.Div, 2002)했다.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국제학생회(ISF)에서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했고, 서울시민교회에서 6년간 부목사로 사역했다. 현재는 VIEW에서 공부하고 있다.
'관련 도서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알리스터 맥그라스, <도킨스의 신>과 <도킨스의 망상>을 깨다! (0) | 2020.11.18 |
|---|---|
| “뇌, 도대체 어떻게 설계된 것일까?”<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CUP 간) (0) | 2020.11.17 |
| 신천지 거짓 교리 박살내는 <이만희 실상 교리의 허구>(진용식 목사 저) (0) | 2020.11.02 |
| 백신 사망자 논란 무엇이 진실일까?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하고 경고한, 『살인 미생물과의 전쟁』 (0) | 2020.10.27 |
| 박해경 박사의『칼빈의 조직신학』 (0) | 2020.10.26 |



